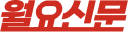19세기 서양에서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라는 번역어로 소개하여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이 되었다.
나는 고교 시절 영어 선생님을 통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름을 시적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인보다 한국과 한글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이 번역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을 보고 의아했다.
1882년 미국인 윌리엄 그리피스가 그의 저서 「은둔의 나라, 코리아」(COREA, The Hermit Nation'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선(朝鮮)의 이름을 ‘Chó-sen(고요한 아침 또는 신선한 아침)’으로 소개했다.
그리피스는 은둔의 나라 이미지로 문학적 수사 ‘고요한’을 삽입해서 일본의 이미지 ‘일출 왕국’과 대비한 것이다. 퍼시벌 로웰도 1886년 그의 저서에서 조선을 가리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도 1911년 한국 여행을 기록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출간하였으며, 1925년 촬영한 기록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독일 전역에서 상영했다.
헐버트는 ‘조선’에 대한 이 번역은 오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선의 ‘선’(鮮)은 ‘조용하다’는 의미 ‘calm'이 아니라 ’신선함‘(freshness)을 의미하므로 ’조선‘은 서광이 비치는 ‘아침 햇살의 나라’(The Land of the Radiant Morning)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헐버트가 아름다운 이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번역을 왜 그렇게 강하게 배척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당시 서양 열강이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조선을 바라보며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서양 열강이 식민지 개척의 야심을 품고 은둔의 나라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접근하지 않았는가?
1904년 런던의 한 수도원 행사에서 그리피스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은 영국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자 헐버트는 그에게 다가가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며 큰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은둔국의 이미지는 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하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는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당시에도 이미 은둔의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은 1876년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기계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884년 미국의 에디슨전등회사와 전기시설 도입을 계약하고, 1887년 3월 경복궁에 백열등을 밝혔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1899년 서울에 전차를 개통하고, 경인선 철도를 완공하였으며, 1900년 한강 철교를 준공하였다.
1885년 제중원 설립을 후원하면서 서양식 병원을 태동시켰고, 1886년 육영공원을 설립하여 근대식 교육기관을 열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사립학교 설립을 인가하여 근대식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의 길을 열었다.
또한 1897년 조선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막은 것이다.
그렇지만 고종 황제가 서거하자 1919년 3월 1일 잠자던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드디어 다시 일어났다.
당시 한반도에는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었지만, 아침 햇살의 나라 조선의 국민들은 자주 독립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은 헐버트가 예언한 대로 ‘잠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 유원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