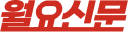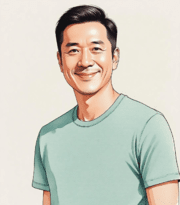
우리가 자동차에 올라탄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뭔가? 시동 버튼을 누르기 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기 전, 사실은 안전벨트를 맨다. 무심코 당겨 채우는 그 순간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그 속에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발전이, 인류와 맺은 최소한의 약속이 담겨 있다.
안전은 늘 자동차 산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 1886년 메르세데스-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꿔왔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도로가 넓어질수록, 기술이 진보할수록 안전은 언제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였다. 여기서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다른 전략을 취했다. 어떤 브랜드는 속도를, 어떤 브랜드는 럭셔리를, 또 다른 브랜드는 디자인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안전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은 브랜드는 드물다. 그중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볼보’다.
볼보는 1959년, 세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발명하고 특허를 무상 공개했다. 물론 안전을 향한 노력은 볼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프리-세이프(PRE-SAFE)'라는 개념을 만들어 충돌 전 탑승자의 자세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일찍부터 상용화했다. 아우디와 BMW는 야간 보행자 감지,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안전장치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왔다. 심지어 토요타 역시 '세이프티 센스'를 전 차종에 기본화하며 안전을 '사치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확장했다. 결국 각 브랜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안전을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안전'보다는 무상 '공개'에 있다.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선언. 그리고 그 결정은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안전은 기술적 장치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최근 필자는 볼보의 소형 전기 SUV, EX30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했다. 크로스컨트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차체는 아담하다. 기본형(EX30)에 19mm 지상고를 높여 SUV 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위대한 퍼포먼스'다. 소박한 볼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앉으면 시야가 넓게 열렸고, 스티어링 휠은 단단하면서도 정교하다. 숫자로만 체감하면 단 3.7초의 제로백(0-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탑승자를 놀라게 한다. 날렵하게 생긴 태생부터 남다른 포르쉐 타이칸 전기 세단이 동일한 수치라니 말 다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내는 428마력이 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잊고 있다. 바로 볼보가 항상 추구해오던 '안전'이다. 지금까지 이 브랜드에서 어떤 모델을 내놓더라도 자부심은 있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EX30 크로스컨트리에는 5개의 레이더, 5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탑재됐다. 음성인식 기능도 꽤 앞서가고 있다. 이 같은 센서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안전은 더 나아가 자율주행으로 연결된다. 이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베타를 통해 '미래의 안전'을 실험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세계 최초로 법적 허용을 받았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줄여 생명을 지키려는 안전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의존이 높아질수록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는 새로운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사각지대 경보가 켜질 때의 작은 안도감,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미세한 조향 보정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금 느낀 건, 안전이란 본질이 기술의 진화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안전은 기술의 발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태도, 사회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아무리 정교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순간 그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센서와 레이더가 아무리 빽빽하게 둘러져 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명제가 여기서 나온다.
우리 사회의 교통 문화를 떠올려보자. 여전히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이들이 많다. 어린이 카시트 장착률은 선진국보다 한참 낮고, 이륜차의 헬멧 미착용은 흔한 풍경이다. 신호등 앞 횡단보도에 차가 멈추지 않는 장면은 일상처럼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다.
전동화라는 격변의 시기, 자동차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내세운다. 더 빠른 충전 속도, 더 긴 주행거리, 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하지만 이 모든 경쟁의 끝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아마도 안전을 잊지 않는 곳일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본능적으로 원하는 건 여전히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반 위험 예측, 차량 간 통신(V2X) 등은 모두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속도와 편의성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착지에 무사히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은 기술의 종착점이자 다시 출발점이 된다.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와의 짧은 만남은 그래서 의미심장했다. 이 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동화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이 브랜드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기술적 스펙보다 훨씬 오래 기억될 메시지다. / 도윤 자동차 칼럼니스트
- 현대차, 5년간 77조 투자...2030년 555만대 판매 목표
- 티맵모빌리티의 '진화'… 데이터·AI 결합 '모빌리티 플랫폼' 도약
- 500kg 적재 가능 '무쏘 EV", 반년여 만에 연 판매목표 초과
- 세닉 등 르노 전동화차 영국서 리콜..."국내는 해당 없어"
- 미래형 차 완성하는 삼성·LG디스플레이
- 확 바뀐 獨3사 인테리어...더 뚜렷해진 브랜드 철학 차이
- BMW, 7시리즈·XM 의전 차량 지원 ‘ 미스지콜렉션‘ 성료
- [칼럼] 작은 시작, 그러나 큰 성장을 만드는 스타트업 홍보
- [칼럼] 거리를 묻고, 삶을 잇다: 자동차가 빚어낸 문명의 지도
- [칼럼] MZ세대 일상 문화로 자리 잡은 '비대면 타로'